2011. 11. 14. 14:17ㆍ旅行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2/2011081200787.html?bridge_pm

▲ 2011.12.21.(수) 김해공항

▲ 2011.12.21.(수) 김해공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濟州島)를 비롯하여 비양도(飛揚島)·우도(牛島)·상추자도(上楸子島)·하추자도(下楸子島)·횡간도(橫干島)·가파도(加波島)·마라도(馬羅島) 등 8개의 유인도와 54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도는 육지와 고립된 섬이었으나 국민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육지와의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 오늘날에는 전국 제일의 관광지역으로 발전했다. 제주해협을 사이에 두고 목포와 약 140km 떨어져 있는 제주도는 윤곽이 대략 동서방향으로 가로놓인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남북간의 거리가 약 31km, 동서간의 거리가 약 73km이다. 면적은 남한 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인구는 남한 인구의 1.2% 정도를 차지한다. 행정구역은 2행정시 7읍 5면 62동(법정동 기준, 행정동 기준은 31개)으로 되어 있다. 특별자치도청소재지는 제주시 문연로이다. 면적 1848.43㎢, 인구 563,388명. 인구밀도 304.8명/㎢(2007).
육지와 멀리 떨어진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는 고을나(高乙那)·양을나(良乙那)·부을나(夫乙那)가 삼성혈(三姓穴)에서 용출한 것으로 시작된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백제, 후에는 신라와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탐라국이 육지에 직접 예속되어 행정구역으로 편제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중엽인 1105년(숙종 10)부터이다. 1271년(원종 12)에 삼별초(三別抄)가 제주도에 웅거하면서 몽골에 마지막까지 항쟁을 벌이다가 1273년에 패한 후 제주도는 원나라의 직할지가 되어 목마장(牧馬場)이 설치되었다. 원의 직할지였던 까닭에 다른 곳보다도 몽골의 문화적인 영향이 컸으며, 대규모 목마의 흔적으로 환경에도 뚜렷한 자취를 남겨놓았다. 그후 약 1세기 동안 제주도는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 소속이 여러 차례 바뀌는 복잡한 과정을 겪다가 1367년(공민왕 16)에 완전히 고려에 회복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 1416년(태종 16)에 한라산을 경계로 북쪽에 제주목(濟州牧)을 두고, 남쪽의 동부에는 정의현(旌義縣), 서부에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여 전라도에 소속시켜 조선시대 동안 유지되었다.
1864년에 정의현과 대정현을 군으로 승격했으며, 지방제도 개정에 의해 23부제(府制)를 실시함에 따라 1895년에 제주부를 설치하여 정의군·대정군을 관할하도록 했다. 1896년에 다시 13도제(道制) 실시로 전라남도 제주군·정의군·대정군이 되었다. 1914년에 시행된 군면 폐합 때 정의군·대정군과 완도군 추자면이 제주군에 병합되어 제주군은 제주도 전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1915년에 도제(島制)를 실시하여 제주도라 했으며, 1946년에 비로소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제주도(濟州道)로 승격하고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을 신설했다. 1955년에 제주읍을 시로 승격하고, 1956년에는 서귀면·대정면·한림면을 각각 읍으로 승격하고 한경면을 신설했다. 1980년에 애월면·구좌면·남원면·성산면을 읍으로 승격했으며, 1981년에 서귀읍과 중문면을 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했다. 1985년에 조천면을 읍으로, 1986년에 구좌읍 연평출장소를 우도면으로 승격했다. 조선시대까지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던 제주도는 1948년의 이른바 제주 4·3사태 등 현대사의 아픔을 겪으면서 취락의 구조 등에도 변화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변모는 196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져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감귤 등의 상품작물의 재배지로 지역의 특성이 변모되었다.
2006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자치지역으로 전환되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로 출발했다. 자치 입법권 강화, 자치조직·인사 자율성 강화, 의정활동 강화, 주민참여 확대, 자주 재정권 강화, 교육자치 강화, 자치경찰제 실시 등 자치기능이 확대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어 2행정시, 7읍·5면·31동으로 개편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으며,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제주시 삼도2동의 관덕정(觀德亭:보물 제322호)은 조선시대의 관아가 있던 곳이며 제주시 이도동의 삼성혈(三姓穴:사적 제134호)이 있다. 문화행사로는 한라문화제·유채꽃큰잔치·제주감귤축제·한라산철쭉제 등이 있다.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한라문화제는 1962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10월에 개최되며, 민속예술경연·조랑말경주·잠수경기 등의 민속행사가 문화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2008년 현재 교육기관은 유치원 110개소, 초등학교 106개교(분교 12개교 미포함), 중학교 42개교, 고등학교 30개교, 전문대학 3개교와 제주대학교·탐라대학교가 있다. 2007년 현재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6개소, 병원 4개소, 의원 299개소, 치과의원 137개소, 한의원 116개소, 보건소 17개소가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과 그밖에 자연 및 민속과 관련된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숙박·교통 등의 관광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한국 제일의 관광지역으로 발전했다. 도내의 수많은 관광지 중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는 30여 개소에 이르는데, 특히 천지연·천제연·정방 등의 폭포, 김녕사굴·협재굴·쌍룡굴 등의 용암굴, 성산일출봉·산방산·산굼부리 등의 기생화산과 용두암·외돌괴·안덕계곡·비자림 같은 경승지, 삼성혈·항파두리항몽유적지 등의 사적지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성읍민속마을이 인기가 높다. 관광객은 3~5, 8~11월에 많으나 연중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다.
용두암(龍頭巖)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동 용연 부근의 바닷가에 용머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로, 높이는 10m이다.
용두암은 지질학적으로 보면 용암이 분출하다가 굳어진 것으로 용담동 용연 부근의 바닷가에 위치한 높이 10m의 바위이다. 그 모양이 용머리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용두암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옛날 용궁에 살던 이무기 한마리가 하늘로 승천하고자 했으나 쉽지 않았다. 한라산 신령의 옥구슬을 가지면 승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안 용은 한라산 신령의 옥구슬을 몰래 훔쳐 용현 계곡을 통해 무사히 몸을 숨겨 내려 왔으나 용현이 끝나는 바닷가에서 승천하려다 들키고 말았다. 승천을 하는 순간 대노한 한라산 신령의 화살을 맞고 바다에 떨어졌다. 용은 승천하지 못한 한과 고통으로 몸을 뒤틀며 울부짖는 모습으로 바위가 되었다.
또 다른 전설로는 용왕의 사자가 한라산에 불로장생의 약초를 캐러 왔다가 산신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시체가 물에 잠기다가 머리만 물위에 떠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전설도 전해져 내려온다.

▲ 2011.12.21.(수) 용두암

▲ 2011.12.21.(수) 용두암

▲ 2011.12.21.(수) 용두암

▲ 2011.12.21.(수) 용두암 인근
관덕정(觀德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 1동에 자리한 군사훈련용으로 지어진 조선시대 건물.
보물 제322호. 1448년(세종 30) 제주목사 신숙청(辛淑晴)이 군사훈련청으로 창건한 것으로 제주도에 있는 전통적인 건물 중 가장 크다. 1480년(성종 11) 목사 양찬(梁讚)이 중수했고, 1690년(숙종 16) 이우항(李宇恒)이 개축하고, 1753년(영조 29) 김몽규(金夢圭)가 중창했다. 현재의 건물은 1850년(철종 1)에 재건한 것을 1969년에 보수한 것이다. 특히 1924년 관덕정 옆으로 도로를 낼 때 깊은 처마가 걸린다고 해서 일본인들에 의해 처마가 45㎝가량 절단되어 기둥 간살이의 담벼락이 제모습을 잃게 되고, 처마의 깊이와 기울기가 육지의 것과 비슷하게 되었다. 앞면 5칸, 옆면 4칸의 단층 팔작지붕으로 사방이 뚫려 있다. 장대석 바른층쌓기를 한 높지 않은 이중기단 위에 원뿔 모양으로 다듬은 초석을 놓고 26개의 둥근 기둥을 세웠다. 기둥 위에는 이익공(二翼工) 형식의 공포를 얹었고, 기둥 사이에 3개의 화반(花盤)을 놓았으며, 화반 위에 운공(雲工)을 끼웠다. 지붕틀은 7량 구조로 내부에 4개의 고주를 세워 대들보를 받치고 있다. 전면 툇간에는 마루를 깔지 않고 장방형 현무암판을 깔아 우물마루를 깐 나머지 부분과 구별하고 있다. 내부의 포벽(包壁)에는 처음 만들 때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7폭의 벽화가 남아 있다. 1702년(숙종 28) 이형상(李衡祥)이 제주목사로 지내는 동안 견문한 것들을 기록한 〈남환박물 南宦博物〉에 관덕정에 관한 기록도 있다.

▲ 2011.12.21.(수) 관덕정

▲ 2011.12.21.(수) 관덕정

▲ 2011.12.21.(수) 관덕정
제주목 관아(濟州牧 官衙)
제주 제주시 삼도2동 43-3번지 등 일원에 있으며 관아란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보던 건물로서 제주목 관아터는 제주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였다. 발굴조사 결과 탐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관아의 중요한 시설이었던 동헌·내아 건물터 등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제주목 관아터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 중심지 구실을 한 중요한 곳임이 밝혀졌다. 관아터 남서쪽에는 병사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선 세종 30년(1448)에 세운 관덕정(보물 제322호)이 있다.

▲ 2011.12.21.(수) 제주목 관아

▲ 2011.12.21.(수) 제주목 관아

▲ 2011.12.21.(수) 제주목 관아

▲ 2011.12.21.(수) 제주목 관아

▲ 2011.12.21.(수) 제주목 관아

▲ 2011.12.21.(수) 제주목 관아

▲ 2011.12.21.(수) 제주목 관아
흑돈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509, 064-747-0088)

▲ 2011.12.21.(수) 흑돈가
삼성혈(三姓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사적지로 사적 제134호.
〈고려사〉에는 모흥혈(毛興穴)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의 제주도인 탐라(耽羅)의 개국신화에서 고(高)·양(良:지금의 梁)·부(夫) 3성씨의 시조인 고을나(高乙那)·양을나(良乙那)·부을나(夫乙那)가 솟아난 것으로 전해지는 구멍이다(→ 색인 : 삼성신화). 삼성혈은 땅 위에 옴폭하게 패인 작은 구멍들인데, 사적의 보호를 위해 울타리로 막아놓았다. 밑변이 넓은 3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3각형의 위쪽 모서리를 이루는 구멍에서 고을나가, 왼쪽 구멍에서 양을나가, 오른쪽 구멍에서 부을나가 솟아났다고 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둘레가 6자이며 바다까지 이어져 있고 나머지는 둘레가 3자라고 전해지지만, 지금은 그 자취만 남아 있을 뿐이다.
삼성혈이 성역화된 것은 조선 중종 때의 목사인 이수동(李壽童)이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후손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한 데에서 연유한다. 이수동은 삼성혈의 북쪽에 혈비(穴碑)와 홍문(紅門)을 세우고 11월에 유교식으로 혈제를 지내도록 했다. 숙종 때 절제사 유한명(柳漢明)은 삼성혈의 동쪽에 삼을나묘(三乙那廟:지금의 三聖殿)을 세웠고, 순조 때 방어사 이행교(李行敎)는 전사청(奠祀廳)을 지었으며, 헌종 때 방어사 장인식(張寅植)은 숭보당(崇報堂)을 세웠다. 현재는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삼성전에서 매년 봄가을에 춘추제(春秋祭)를 지내고, 혈단에서는 매년 12월 10일 건시제(乾始祭)를 행하고 있다. 사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모두 2만 3,420㎡에 달한다.

▲ 2011.12.21.(수) 삼성혈 입구 건시문

▲ 삼성혈
김녕사굴(金寧蛇窟)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에 있는 용암동굴로 천연기념물 제98호. 용암이 흘러서 된 천연 터널이며, 높이 19m, 폭 10m, 길이 705m이다. 한·일 합동 동굴 조사팀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긴 용암굴인 만장굴과 같은 동굴계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굴 입구는 높이 60m 지점에 있으며, S자형의 동굴형태는 지표함몰에 의한 협착부에 의해 3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1동굴은 52m, 제2동굴은 상층부 54m, 하층부 156m, 제3동굴은 352m이다. 동굴 내부에는 규산화(硅酸華)가 부착되어 있는 모식적인 용암선반과 대규모의 용암폭포 등이 특이한 경관을 이룬다.
사굴(蛇窟)이란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굴속에는 큰 구렁이가 살고 있었는데, 매년 봄·가을에 만 15세의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 그런데 1516년(중종 11) 이곳에 부임한 판관(判官) 서린(徐燐)이 주민을 괴롭혀온 구렁이를 용감하게 없애버렸다고 한다. 동굴 입구에는 판관 서린의 추모비가 있다.

▲ 2011.12.21.(수) 김녕사굴 입구 안내판
만장굴(萬丈窟)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에 있는 동굴로 김녕사굴과 함께 천연기념물 제9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길이 1만 3,268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용암동굴이다.
본래는 '만쟁이굴'로 불렸으나, 1947년 부종휴에 의해 지금의 제2입구가 발견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학술조사가 실시된 것은 1977년부터이다. 1977~86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한일합동동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특히 1981년 제2차 한일합동조사에서는 주위에 있는 김녕사굴을 포함하여 전체가 동일한 용암동굴계로서 세계 제일임이 확인되어 국제화산동굴학회의 공인을 받았다. 이 동굴은 신생대 제3기말에서 제4기초에 걸쳐 일어난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으며, 지층은 표선리 현무암층이다. 동굴 내부의 연평균기온은 9~17℃, 습도는 87~100% 정도이다. 굴은 같은 방향으로 2중, 3중의 동굴이 발달해 있으며, 굴속에는 박쥐·지네·거미류 등의 동물군과 양치류의 식물군이 있다. 거대한 규모의 용암주와 용암종유석·용암교·용암선반 등이 기묘한 현상으로 발달해 있어 최근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한국 제일의 관광 동굴로 개발되어 있다.

▲ 2011.12.21.(수) 만장굴 광장

▲ 2011.12.21.(수) 만장굴 입구

▲ 2011.12.21.(수) 만장굴 입구

▲ 2011.12.21.(수) 만장굴 내부

▲ 2011.12.21.(수) 만장굴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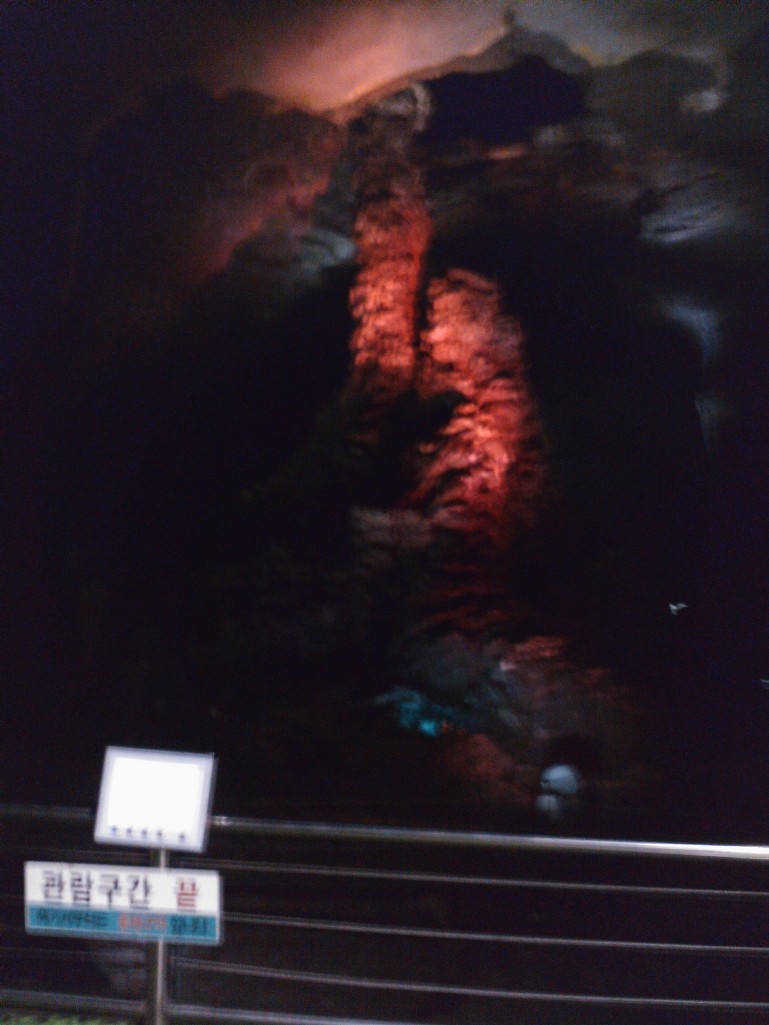
▲ 2011.12.21.(수) 만장굴 내부

▲ 2011.12.21.(수) 만장굴 내부
성산일출봉(城山日出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한라산의 기생화산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6호. 제주도 최동단인 성산포구 앞에 솟아 있다. 높이가 182m 정도이나 지름 약 400m, 넓이 2.64㎢에 이르는 넓은 분화구의 호마테(Homate)형 화산이다. 신생대 제4기층에 형성된 성산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바다 속에서 화산쇄설물들이 퇴적된 화산사암층(火山砂岩層)이다. 해저에서 분출되어 이루어진 분화구가 융기하면서 침식작용을 심하게 받아 기암절벽을 이루며, 측면에는 층리가 발달되어 있다. 산 전체가 하나의 움푹한 분화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화구의 주변에는 구구봉이라 불리는 99개의 바위들이 솟아 있다. 그 모습이 거대한 성과 같아 성산이라 하며, 일출을 볼 수 있어 일출봉이라고도 한다. 이곳에서 보는 해돋이는 성산일출이라 하여 예로부터 영주12경(瀛洲十二景) 가운데 제1의 절경으로 손꼽힌다. 본래는 육지와 떨어진 고립된 섬이었으나, 폭 500m 정도의 사주가 1.5㎞에 걸쳐 발달하여 일출봉과 제주도를 연결했다. 분화구 안은 넓은 초지가 발달하여 소·말·양 등의 방목지로 이용되며, 띠와 억새풀 등이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다. 이것들은 연료로 쓰이며, 특히 띠는 초가지붕을 잇는 데 이용되었다. 벼랑에는 풍란과 춘란을 비롯한 15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북서쪽 능선은 경사가 완만하여 일출봉 호텔을 비롯한 위락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곳을 통해 분화구 안으로 출입한다. 현재 군에서 유료관광지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바다낚시와 성산포 일주유람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의 중문관광단지와 인접해 있어 국제적 관광지로 발달하고 있다.

▲ 2011.12.21.(수) 성산일출봉 입구

▲ 2011.12.21.(수) 성산일출봉 입구

▲ 2011.12.21.(수) 성산일출봉 입구

▲ 2011.12.21.(수) 성산일출봉

▲ 2011.12.21.(수) 성산일출봉 입구

▲ 2011.12.21.(수) 성산일출봉 입구
정방폭포(正房瀑布)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폭포로 높이 23m, 너비 8m, 깊이 5m이다. 서귀포 동쪽 해안에 있는 동양 유일의 해안폭포로서 폭포수가 바다로 직접 떨어진다. 마치 하늘에서 하얀 비단을 드리운 것 같다 하여 정방하포(正房夏布)라고도 부르며, 예로부터 영주12경 가운데 제5경으로 유명하다. 숲에서 보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먼 바다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더 아름다우며 앞바다에 있는 숲섬·문섬·새섬·범섬에는 난대림이 울창하여 남국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폭포 절벽에는 중국 진나라 때 진시황의 사자인 서불(徐市)이 한라산에 불로초를 캐러 왔다가 구하지 못하고 서쪽으로 돌아가면서 새겨놓은 '서불과차'(徐市過此)라는 글자가 있으며, 서귀포라는 지명도 여기서 유래했다고 한다. 해변을 따라 서쪽으로 300m를 가면 잘 알려지지 않은 해식동굴이 있으며 내부에는 큰 석불좌상이 있다.

▲ 2011.12.22.(목) 정방폭포 가는 길

▲ 2011.12.22.(목) 정방폭포 가는 길

▲ 2011.12.22.(목) 소정방폭포
천지연폭포(天地淵瀑布)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폭포로 높이 22m, 너비 12m, 수심 20m이다.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루며, 아열대성·난대성 상록수가 우거져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천지연계곡 내에 있다. 이 일대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체의 식물채집·벌목·야생동물포획 등이 금지되고 있다. 특히 서귀포담팔수나무자생지(천연기념물 제163호)를 비롯해 가시딸기·송엽란·산유자나무·수실잣밤나무·백량금·산호수 등 희귀식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폭포 아래 20m의 못 속에는 열대어의 일종인 무태장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27호)가 있고, 천지연 난대림지대는 천연기념물 제379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 2011.12.22.(목) 천지연폭포

▲ 2011.12.22.(목) 천지연폭포
외돌개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477~1182번지의 서귀포 칠십 리 해안가를 둘러싼 기암절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0m높이의 기둥 바위인 외돌개이다. 서귀포 시내에서 약 2㎞쯤 서쪽에 삼매봉이 있고 그 산자락의 수려한 해안가에 우뚝 서 있는 외돌개는 약 150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섬의 모습을 바꿔놓을 때 생성되었다. 꼭대기에는 몇 그루의 소나무들이 자생하고 있다.
서홍동은 근대적인 감귤농업은 1913년 서홍동 소재 현 제주농장
분토왓, 동과수원)이 효시이며, 그 후 1950년대 중반 이후 재일동포들에 의해 일본에서 묘목이 반입되기 시작, 가장 소득이 높은 작물로 각광을 받았고 한때 ‘대학나무’라고도 일컫기도 했다.

▲ 2011.12.22.(목) 외돌개

▲ 2011.12.22.(목) 서귀포 서홍동 밀감농원
천제연폭포(天帝淵瀑布)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폭포로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으며, 상·중·하의 3단 폭포를 이루고 있다. 제1폭포는 높이 22m의 절벽 아래로 떨어져 깊이 21m의 천제연을 이루며, 다시 제2·3폭포를 만든 뒤 바다로 흘러든다. 천제연이라는 이름은 옥황상제의 선녀들이 밤에 이곳에 내려와 목욕을 한 데서 유래한다. 선림교에서 바라보는 폭포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절경을 이루며, 천제연은 단애와 바닥의 점토층에서 생수가 솟아 1년 내내 맑은 물을 유지한다. 폭포 양안에는 서귀포담팔수나무·송엽란 등의 희귀식물이 자생하며, 그밖에 조록나무·감탕나무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목류와 덩굴식물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현재 천제연계곡 일대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폭포를 중심으로 하여 8㎞에 이르는 해변과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국제규모의 관광단지가 조성되었고, 식물원과 로얄마린파크 등이 있다. 천제연 난대림지대는 천연기념물 제37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 2011.12.22.(목) 천제연폭포 선임교(仙臨橋) 위 멀리 천제루 지붕
산방산(山房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으로 높이 395m. 모슬포로부터 동쪽 4㎞ 해안에 있다. 유동성이 적은 조면암질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종상화산(용암원정구)이다. 화구가 없고 사면경사가 50° 내외이며, 사방이 절벽을 이룬다. 신생대 제3기에 화산회층 및 화산사층을 뚫고 바다에서 분출하면서 서서히 융기하여 지금의 모양을 이루었다. 북쪽 사면 일대는 인위적인 식목림과 초지를 이루고 있다. 산정부근에는 구실잣밤나무·후박나무·겨울딸기·생달나무 등 난대림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유일한 섬회양목 자생지이기도 하다. 암벽에는 지네발란·동백나무겨우살이·풍란·방기·석곡 등 해안성 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도라지가 서식하고 있다. 학술연구자원으로 매우 가치가 높아 1966년 천연기념물 제182-5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또한 산양이 서식하고 있다.
이 산에는 옛날 한 포수가 한라산에 사냥을 나갔다가 잘못해서 산신의 궁둥이를 활로 쏘자
신이 노하여 손에 잡히는 대로 한라산 봉우리를 뽑아 던진 것이 날아와 산방산이 되고 뽑힌 자리가 백록담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또한 여신 산방덕과 고승(高升)이란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곳의 주관(州官)으로 있던 자가 산방덕의 미모를 탐내어 남편 고승에게 누명을 씌우고 야욕을 채우려 하다가 이를 알아차린 산방덕이 속세에 온 것을 한탄하면서 산방굴로 들어가 바윗돌로 변해버렸다는 전설이 있다. 높이 200m의 남서쪽 기슭에 있는 산방굴은 해식동굴로 부처를 모시고 있어 산방굴사라고도 하는데, 길이 10m, 너비 5m, 높이 5m 정도이다. 고려시대의 고승 혜일(蕙日)이 수도했다고 하며, 귀양 왔던 추사 김정희가 즐겨 찾던 곳이다. 굴 내부 천장 암벽에서 떨어지는 물은 이 산을 지키는 여신 산방덕이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라 하며, 마시면 장수한다는 속설에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다. 산의 남쪽에는 화산회층이 풍화된 독특한 경관의 용머리해안이 있으며, 이곳에 하멜 표류기념탑이 건립되어 있다. 산정에서 바라보는 남해의 마라도·형제도·화순항의 경관이 뛰어나며 이는 제주10경의 하나이다. 정상으로 오르는 4곳의 등산로가 있으나, 주로 북쪽 사면을 이용한다.

▲ 2011.12.22.(목) 산방산
용머리해안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에 있는 천연기념물 526호로 바닷속 세 개의 화구에서 분출된 화산쇄설물이 쌓여 만들어진 해안으로, 성산일출봉, 수월봉과 달리 화구가 이동하며 생성된 지형적 가치가 크다.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수성화산이며, 해안의 절벽은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에 의해 마치 용의 머리처럼 보이는 경관적 가치도 있다.

▲ 2011.12.22.(목) 용머리 해안
서귀포 추사 김정희 유배지(西歸浦 秋史 金正喜 流配址)
※추사유배지 →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로 명칭 변경하였다.(2011.07.28 고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66-1번지 일원에 있는 조선시대 가옥으로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유배생활을 하던 곳이다. 헌종 6년(1840) 안동김씨 세력과의 권력다툼에서 밀려난 김정희는 제주도 대정현에 위리안치(圍離安置. 죄인이 귀양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두던 일)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추사는 이곳에서 9년 동안 책을 읽고 글씨를 쓰는 등 학문에 열중하여 추사체를 완성하고 <세한도>를 비롯한 여러 점의 서화를 남겼다.
서귀포시 대정읍성 동문자리 안쪽에 자리잡은 추사유배지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서화가였던 추사 金正喜(1786∼1856)가 유배생활을 하던 곳이다. 김정희는 영조의 사위였던 김한신(金漢藎)의 증손으로, 조선 순조 19년(1819)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대사성·이조참판 등의 벼슬을 지냈다. 그러다 조선 헌종 6년(1840) 55세 되던 해에 동지부사로 임명되어 중국행을 앞두고 안동김씨 세력과의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유배 초기에 포도청의 부장인 송계순의 집에 머물다가 몇 년 뒤 현재의 유배지로 지정된 강도순의 집으로 이사하였다. 이 집은 1948년 제주도 4·3사건 때 불타버리고 빈 터만 남았다가 1984년 강도순 증손의 고증에 따라 다시 지은 것이다. 김정희는 이 곳에 머물면서 추사체를 완성하고, <완당세한도>(국보 제180호)를 비롯한 많은 서화를 그렸으며, 제주지방 유생들에게 학문과 서예를 가르치는 등 많은 공적을 남겼다. 추사유배지는 추사 김정희선생이 제주에 남긴 유배 문학의 커다란 문화적 가치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금석학과 유학, 서학의 의미는 역사적·학술적으로 크게 평가되고 있다.
<세한도>


문인화의 최고 경지라는 평가를 받는 <세한도>는 김정희가 59세 때인 1844년에 제자인 역관 이상적(1804~1865)에게 그려준 것이다. 이상적은 추사가 지위와 권력을 잃어버린 후에도 사제간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고, 중국 연경에서 스승에게 귀한 책을 조달해주었다. 그 책들로 추사의 학문 세계는 더 깊어졌으며, 이에 대한 답례로 선비정신을 소나무에 비유한 <세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추사는 세한도의 발문에 ‘날이 차가워진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는 <논어>의 한 구절을 적었다.
配所輓妻喪(배소만처상) : 유배지에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추사 김정희가 고향에 있는 부인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쓴 시)
那呼月姥訴冥司(나호월모소명사) : 월하노인에게 저승에 하소연을 하여서라도
來世夫妻易地爲(내세부처역지위) : 내세에서는 부부가 반대로 태어나서
我死君生千里外(아사군생천리외) : 내가 죽고 그대는 천리 밖에서 살아있어
敎君知我此心悲(교군지아차심비) : 그대로 하여금 오늘 이 슬픈 마음을 알게 하리라.

▲ 2011.12.22.(목) 추사 김정희 기념관 뒤편 유배지

▲ 2011.12.22.(목) 눈바람 치는제주시 한경면 해안
산굼부리분화구(산굼부리噴火口)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66-1외 5필의 일원에 소재하며 1979년 6월 18일 천연기념물 제263호로 지정되었다.
산굼부리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측화산으로, 제주도 유일의 폭렬공 측화산이다. 분화구의 깊이는 약 100m, 지름은 600m가 넘는다. 제주 산굼부리분화구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263호로 지정되어 있다.

▲ 2011.12.23.(금) 산굼부리 입구 돌하루방

▲ 2011.12.23.(금) 산굼부리 입구 영봉문

▲ 2011.12.23.(금) 산굼부리 입구 영봉문

▲ 2011.12.23.(금) 산굼부리 입구 돌하루방

▲ 2011.12.23.(금) 산굼부리 입구 표지석

▲ 2011.12.23.(금) 산굼부리 입구 표지석

▲ 2011.12.23.(금) 산굼부리 입구 표지석

▲ 2011.12.23.(금) 제주공항

▲ 2011.12.23.(금) 제주공항 탑승장

▲ 2011.12.23.(금) 제주공항 탑승장

▲ 2011.12.23.(금) 제주공항 탑승장

▲ 2011.12.23.(금) 제주공항 탑승장

▲ 2011.12.23.(금) 제주공항 계류장

▲ 2011.12.23.(금) 창공의 구름

▲ 2011.12.23.(금) 비행기 내

▲ 2011.12.23.(금) 비행기 내

▲ 2011.12.23.(금) 비행기 내

▲ 2011.12.23.(금) 비행기 내

▲ 2011.12.23.(금) 비행기 내

▲ 2011.12.23.(금) 창공의 운해